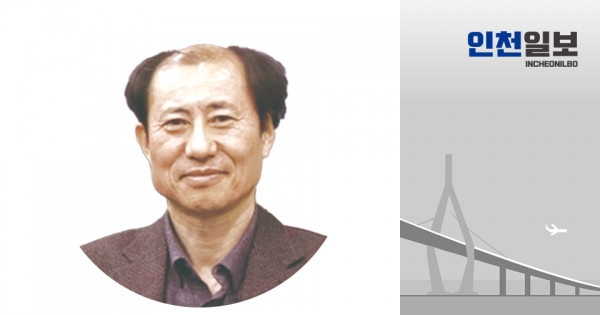
우리는 가끔 'OOO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적잖이 당황하게 된다.
평상시에는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만, 갑자기 질문을 받게 되면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문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그러한 경우이다.
문화(文化)란 무엇인가?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문(文)에 대해 ‘그림을 섞는다(錯畫)’라고 풀이하고 있다. 문(文)자의 갑골문을 보면 팔을 벌리고 있는 사람의 가슴에 문양이 그려져 있는 것을 형상한 것( )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몸에 새긴 ‘문신’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문(文)자의 본래 의미는 ‘몸에 새기다’였다고 한다.
‘화(化)’는 ‘달라지다’, ‘바뀌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과연 어디에서 어디로 달라진다는 것일까? <논어(論語)> ‘옹야(雍也)’편에는 이와 관련된 공자의 말을 전하고 있다. “질(質)이 문(文)을 이기면 촌스럽고(野), 문이 질을 이기면 화사하다(史). 문질(文質)이 빈빈(彬彬)한 연후에 군자이다.”
여기서 질(質)과 문(文)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진양(陳暘, 1064~1128)은 <악서(樂書)>에서 “하후씨(夏后氏)의 예는 질(質)을 숭상하고, 주나라 사람들은 문(文)을 숭상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후씨는 하(夏)나라 우(禹) 왕조를 말하는데, 우(禹)의 이름은 문명(文命)이었다.
그런데 왜 하나라를 질이라 하고 주나라를 일컬어 문이라고 한 것일까? <예기> ‘명당위(明堂位)’에서 “하후씨의 족고(足鼓), 은나라는 영고(楹鼓), 주나라는 현고(縣鼔)”라고 한 말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대개 북의 제작은 이기씨(伊耆氏)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를 토고(土鼓)라고 한다. 흙을 돋우어 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후씨는 여기에다 네 개의 발을 추가하여 족고(足鼔)라고 하였고, 은상의 사람들은 기둥을 꿰뚫어 영고(楹鼓)라고 하였으며, 주나라 사람들은 매달아서 쳤는데, 이를 현고(縣鼓)라고 부른다. 토고는 자연 그대로의 흙을 취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후씨의 족고는 가죽을 사용하여 북을 만든 것이고,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갈수록 그 꾸밈을 더하였던 것이다.
또한 ‘명당위’에서는 “하후씨의 용순거(龍簨虡), 은나라의 숭아(崇牙), 주나라의 벽삽(璧翣)”을 언급하고 있는데, 종경 등을 매다는 틀의 양쪽 기둥을 거(虡)라 하고, 거(虡)에 가로로 댄 나무를 순(簨)이라고 한다. 예로부터 거(虡)를 만드는 원칙이 있었다. 종(鐘)의 거(簴)에는 털이 짧은 짐승으로 만들었고, 경쇠(磬)의 거(虡)에는 날개가 달린 짐승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종경의 순(簨)은 모두 비늘이 달린 짐승, 즉 용으로 만들어야 제대로라고 생각했다.
하(夏) 나라의 순거는 비늘이 달린 용으로 만들었으니 용순거(龍簨虡)라 한 것일뿐 숭아는 없었다. 은나라는 숭아로 장식하되 벽삽이 없었다. 주나라에 이르러 문(文)을 극진히 하여 세 가지를 모두 갖추었던 것이다.
종경을 땅바닥에 놓고 연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부득이 이를 세워서 연주해야 하는데, 이때 원리에 따라서 용(龍)을 사용하여 순(簨)을 만들었으니 이를 질(質)이라 한 것이다. 그런데 은나라는 여기에다 숭아를 보태어 장식하였으며, 주나라는 은나라의 숭아에다 벽삽까지 추가하였으니, 이를 문(文)이라 한 것이다.
공자는 질(質)만 있으면 촌스러워서 문(文)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문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여기었다. 문질이 모자라거나 지나치지 않게 골고루 겸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문화(文化)에는 질(質) 망각 사건이 은폐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송빈산 우현미학연구소장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